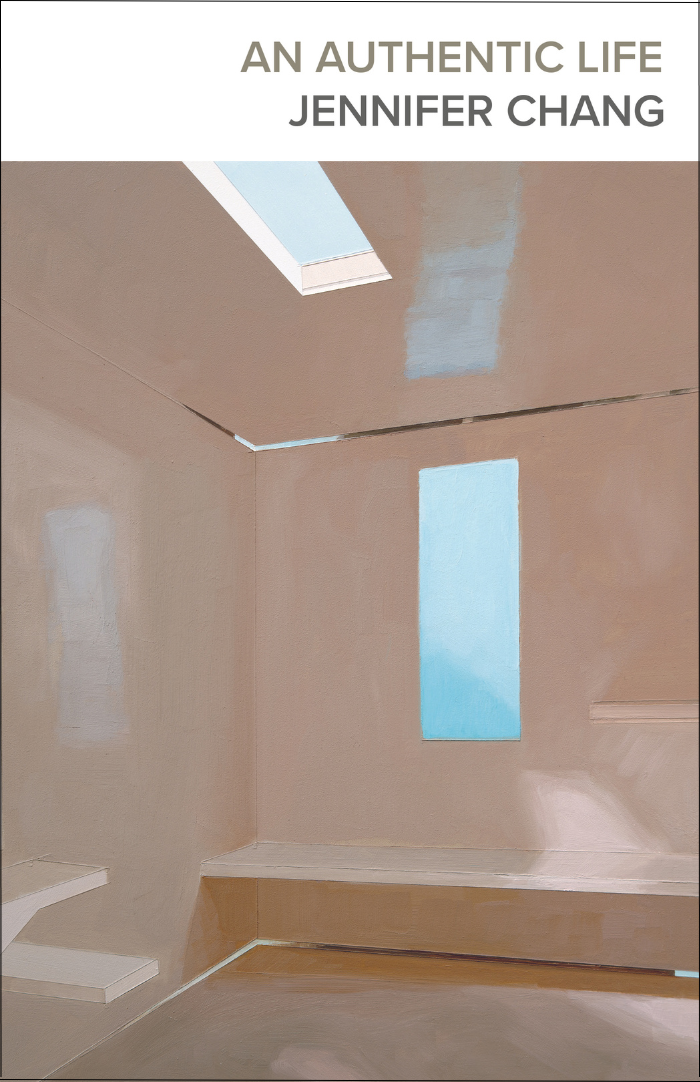
어린이를 양육하는 방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사회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중세 이래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교화하고 계도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던 서구 사회는 근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이 지닌 잠재력과 상상력을 긍정적인 자질로 평가하게 되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이 되고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해 줄 사회적 동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미래 세대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역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경제적 팽창이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어린이에 대한 시각은 큰 전환을 맞았다. 경로사상에 기반하여 부모와 윗사람에게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되던 어린이들은 어느새 미래를 바꿀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사랑과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귀해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지나칠 정도의 추앙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모차나 장난감까지도 어떻게든 제일 좋은 것으로 구해 주려고 애쓴다. 얼핏 보면 어린이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요즈음 가장 많은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노키즈존'처럼 아이들을 배척하는 공간이 생겨나고 어린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사상 초유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는 물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겠지만,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양육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아이들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쉽사리 압도해 버리는 현실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
중국계 미국 시인인 제니퍼 창(Jennifer Chang)의 '순수한 이들'(The Innocent)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 시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시이다. 올해 퓰리처상 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시집 <어느 진짜인 삶>(An Authentic Life)에 수록된 이 시는 시집의 제목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여과 없이 그려 내고 그 속에서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독자와 세밀히 공유한다. 이 시에서 시인이 어머니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실감 나게 그려져서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모습까지도 반추해 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제니퍼 창 - 순수한 이들 (번역: 조희정)
몇 주 동안 우리는 둥지에 밀어 넣어진 세 개의
의기양양한 알들에서 새끼 새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봤지,
그 둥지는 이웃집의 덩굴 안쪽으로
밀어 넣어져 있었어. 시간이 끄덕였고,
끄덕이고 있었지—살아 있음의 조각, 어찌나 퉁명스럽게
바람이 마모를 향해 비틀거리는지. 열심히 일하면서,
두 뒷마당에서 보초를 서며, 울새들은 매일
그들의 영역에서 엄마 아빠 역할을 했어. 그리고 그 너머로,
우리가 살던 블록의 골목이 정처 없이 들판으로 이어졌고,
거기서는 우연히,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지. 새끼 새들은 가로등에, 삼나무 울타리에
앉아서 꽥꽥거렸고, 우리는 허리를 굽혀, 고양이가
오지 못하게 했어, 내 두 어린 아들들도, 모두가
집에서 움직이지 않았지. 나는 지켜보면서 정신이 나가서는
그걸 슬픔이나 이기주의라 생각했어, 어제의
타박상, 하늘이 다른 계절을
풀어낸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지. 그 헐벗은
뼈의 묶음들을 잔디가 잘린 조각,
오래된 잎들로 착각하기는 쉬웠어. 풀 속의
저 동그라미, 깃털들의 대학살. 저
가혹한 고양이. 정신이 나갈 거 같았어.
한 이웃이 말했지,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말자,
세상이 항상 찌꺼기로 향할 운명이라는 걸
알아서 뭐 하게. 다른 이는 말했어, 가,
둥지를 가져가서, 유리 아래 놓고, 그걸 교훈으로 만들어.
대신, 나는 익숙한 일상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 그 덩굴은
느글거리도록 달콤하다가 희미해져서 그저 열기가 되었지.
그걸 과학이라 불러. 다시 여름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찌꺼기야.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시절에 우린 뭘 했어요, 내 아들들이 어느 날 묻겠지. 우리는 살았거나
살아가는 것을 견뎠어. 우리는 죽음에서 눈길을 돌렸던 거야.
시는 새끼 새들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울새들이 이웃집의 덩굴 안쪽으로 둥지를 밀어 넣고 거기에 세 개의 알을 또 밀어 넣는다. 이 알들을 "의기양양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시인은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 새들의 당당한 등장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아직 "살아 있음의 조각"에 불과한 작은 존재들이지만, 이 새끼 새들은 울새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고 보초를 서면서 삶을 이어가게 해 주는 동력이 된다. 시간은 "끄덕이면서" 계속 흘러가고 바람은 "퉁명스럽게" 모든 것을 "마모"시키려 하지만,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무언가 "지켜볼" 것이 생겼다는 기쁨은 울새들 뿐 아니라 시인과 이웃까지도 새끼 새들의 성장에 온 마음을 쏟도록 만든다.
집에서 움직이지 않던 그 시절, 시인은 아마도 "어제의 타박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듯하다. 두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던 중 시인의 삶으로 불쑥 찾아든 새끼 새들은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소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우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기 새들이 꽥꽥거리는 모습에 집중하고 고양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쫓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은 "슬픔"이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새로운 생명체들은 과거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면서 시인의 마음을 잡아끈다. 또, 울새들이 새끼들을 양육하는 모습은 두 아들을 키우는 시인의 삶과 평행 관계에 놓여 있기에, 이들을 지켜보면서 시인은 자존감을 다시 찾아 스스로를 도닥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늘이 다른 계절을 풀어낸다"는 구절로부터 시는 갑자기 다른 분위기로 전환된다. 시인이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지내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닥쳐온 것이다 "그 헐벗은 뼈의 묶음들"이나 "깃털들의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새끼 새들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제시되고,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은 "가혹한 고양이"의 소행이라고 유추된다. 이 예상치 않았던 사건 앞에서 이웃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한 이웃은 "세상이 항상 찌꺼기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말자면서 아기 새들의 죽음을 비밀에 부치자고 말한다. 반면에, 다른 이웃은 "둥지를 가져가서, 유리 아래 놓고" 그걸 "교훈"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혹독한 세태에 대해 배우게 만들자는 제안을 해본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일까? 시인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 "익숙한 일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아기 새들의 죽음 이후 자신의 시선이 변화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 마당에 있던 "덩굴"은 "느글거리도록 달콤하다가" 점점 말라붙어 "희미해져서" 결국은 "열기"만을 남기고 사라져 간다. 계절이 변하고 그에 따라 주변의 생명체들이 사멸해 가는 모습이 이제는 시인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이다. "여름"은 "모든 것이 찌꺼기"로 변하는 계절이며, 시인은 이 잔인한 순환의 질서를 처절하게 인지한다. 새끼 새들이 고양이에게 희생되어 떠나간 것처럼, 시인과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던 자연물들 역시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연물들의 죽음을 가져오는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끝을 상징하는 시간은 겨울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과 새들이 떠나가 버린 차가운 들판 등 사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은 겨울과 연관되어 주로 떠오른다. 그에 비해, 여름의 열기가 많은 것들을 "찌꺼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 시의 전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푸르게 흐드러진 여름의 빛깔 아래에서 수많은 자연물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진정한 비극은 이런 사멸의 현장이 왕성한 성장의 풍경에 가려져서 제대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지워져 버린다는 데 기인할 수도 있겠다.
시인이 새끼 새들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한여름에 일어난 사멸에 대해 아이들에게 결국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점에서 명백해진다. 여름의 풍요로움이 어떤 존재들에게는 위협적인 열기가 되어 소멸로 향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봄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는 진실일 수도 있다.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치열한 경쟁, 가혹한 패배, 그리고 쓸쓸한 죽음에 대해 미리 말한다고 해서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더구나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다른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과연 삶에 어떤 도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시인 자신도 어른이 되어서야 새롭게 발견한 여름의 혹독함을 굳이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어진 삶을 최대한 향유하고 낙관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아닐까? 애써 "죽음에서 눈을 돌리고" 대신 "살아가는 것"을 견뎌냈던 시인의 선택은 '순수'라는 가치의 저력을 일깨우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이끌어 준다.
원문: The Innocent
For weeks we watched for hatchlings to come
of three smug eggs tucked into a nest,
the nest tucked into the crook
of a neighbor's honeysuckle. Time nodded,
was nodding—the shred of living, how offhand
the wind teeters toward erosion. Hard at work,
on guard in two backyards, the robins mothered
and fathered their territory daily. And beyond,
our block's alley stretched aimless as fields,
where watching happens by accident,
by nature. They'd squawk on a streetlamp,
a cedar fence, our back stoop, warning off
the tabby, my two young sons, everyone
stuck at home. I lost my mind with watching
and thought it grief or egotism, the bruise
of yesterday, not least the sky
unraveling another season. It was easy
to mistake the bared skeletal pinions
as lawn clippings, old leaves. That circle
in the grass, a massacre of feathers. That
terrible cat. It was easy to lose my mind.
One neighbor said, let's not tell the children,
why know the world as always fated
toward remnant. Another said, go,
take the nest, set it under glass, and make it a lesson.
Instead, I watched our habits pass, the honeysuckle
fade from sickly sweet to nothing but heat.
Call it science. It's summer again, and then
everything's remnant. What did we do those days,
stuck at home, my sons might some day ask. We lived
or tolerated living. We looked away from death.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