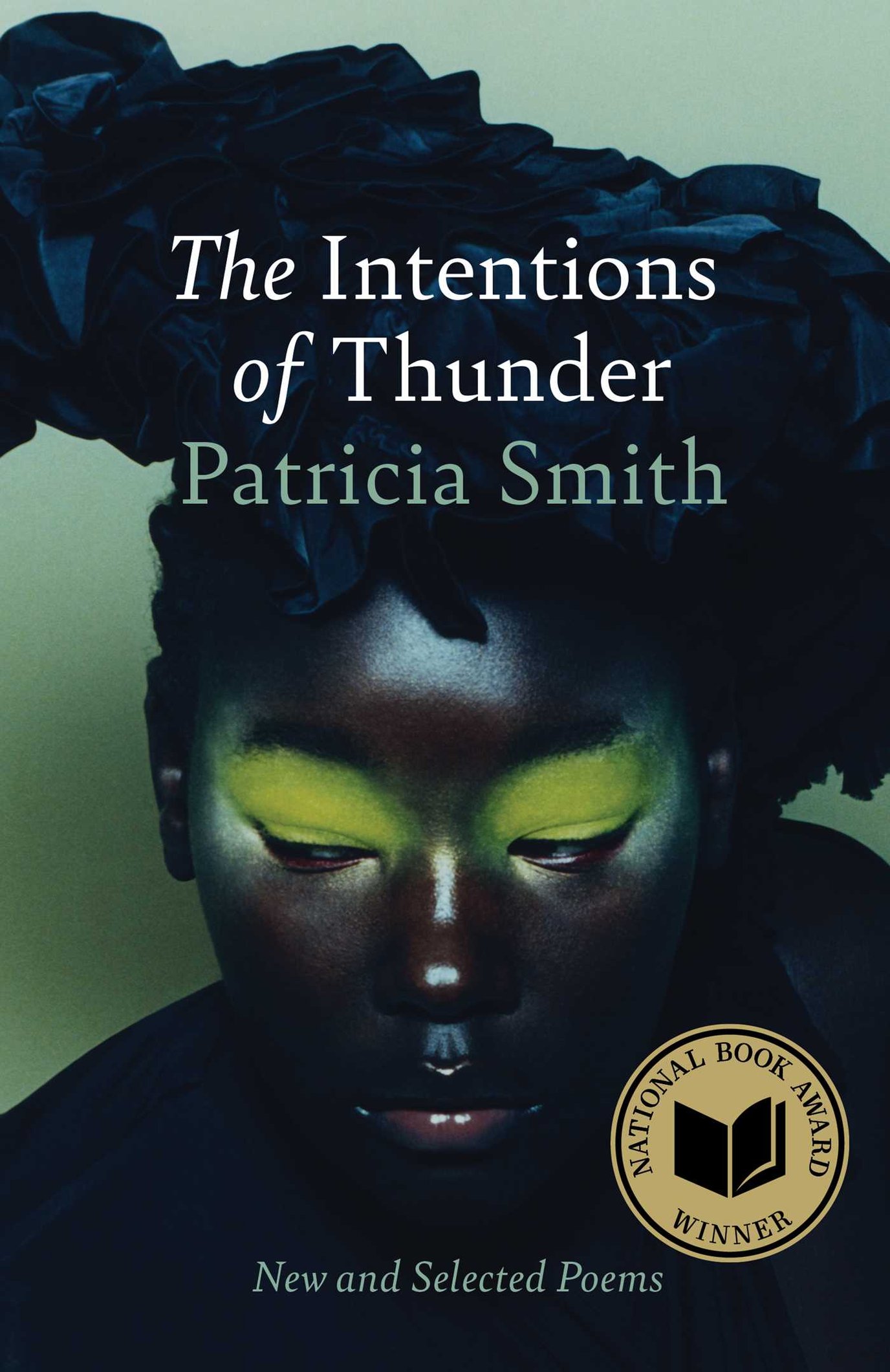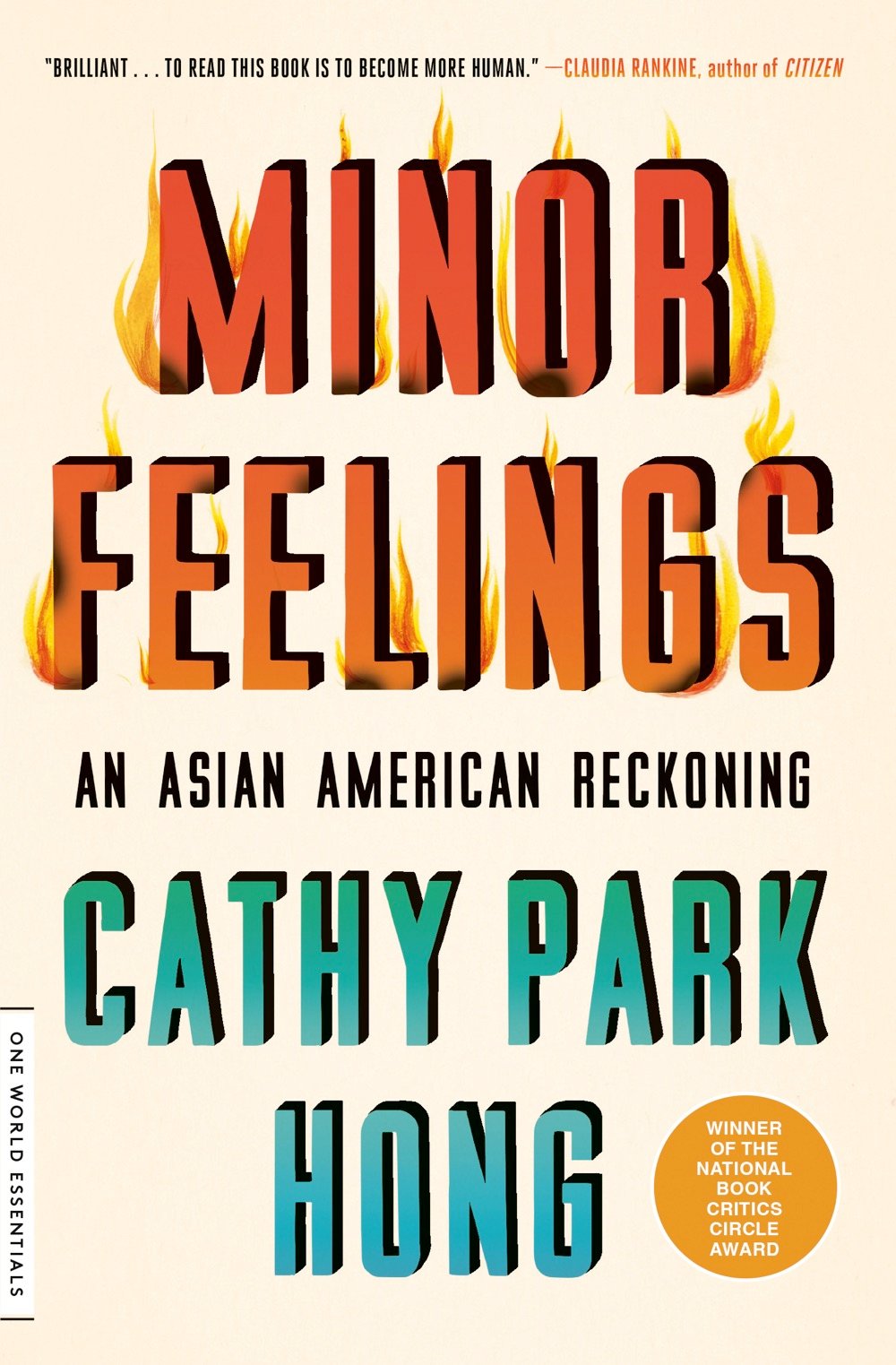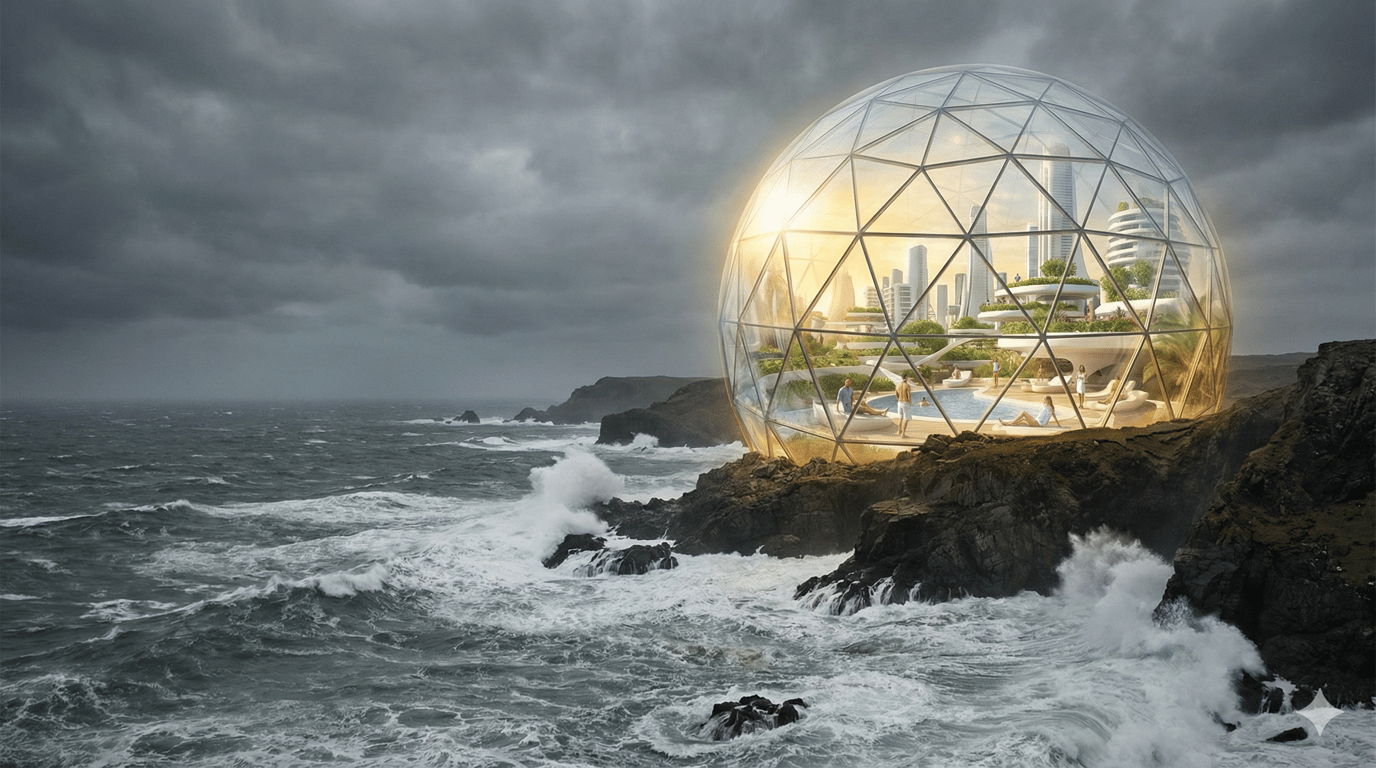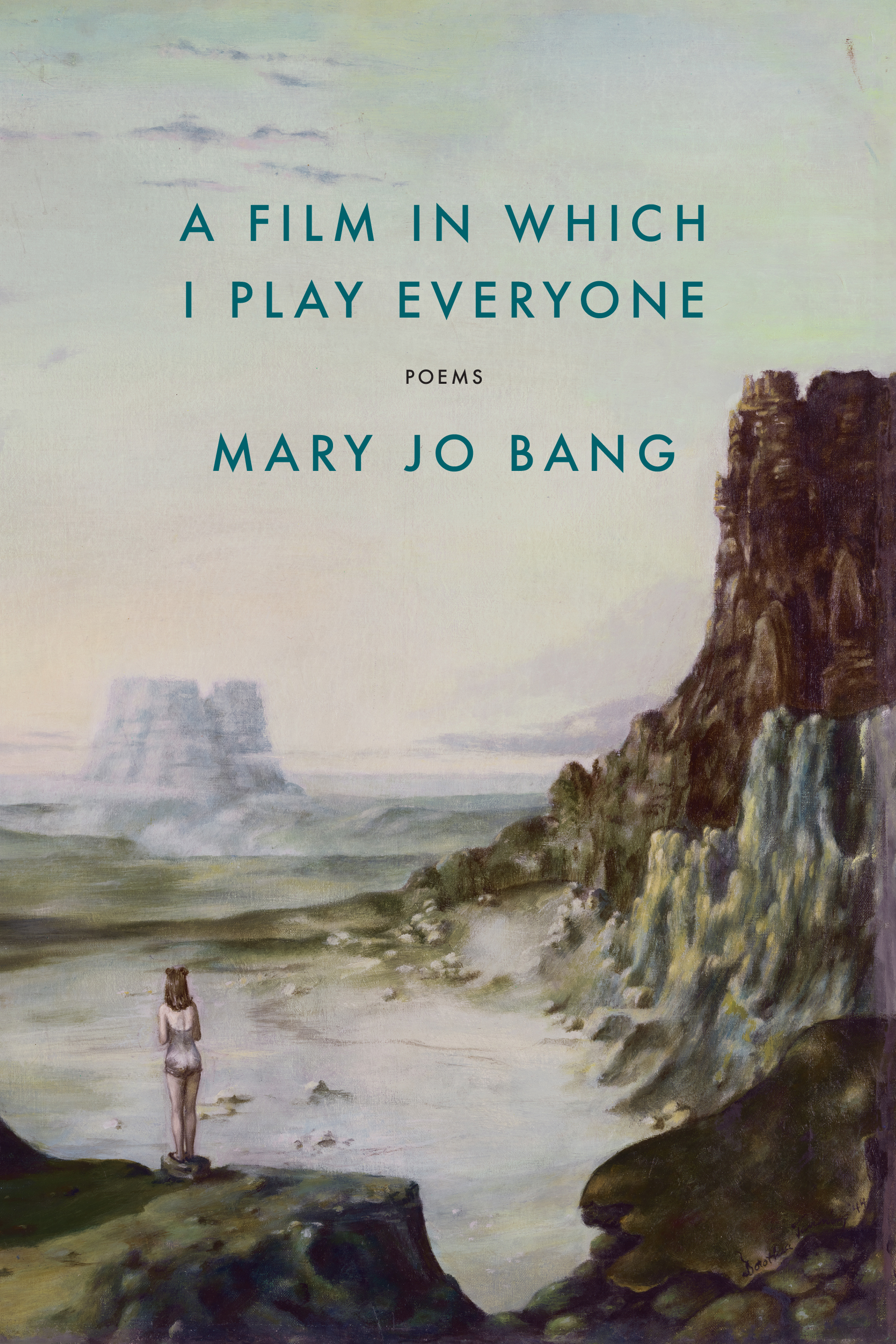
메리 조 방의 시집 '내가 모두를 연기하는 영화' 표지. /사진제공=Graywolf Press
2025.08.29 15:29
- 0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회가 무엇을 숭배하는가를 살피는 일일지 모른다. 흔히 종교에서 신이나 성인을 떠받드는 행위를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숭배의 장면을 목격한다. 거리의 동상, 박물관의 기념관, 텔레비전 화면 속 스타, 심지어 정치 집회나 아이돌 콘서트의 환호까지, 모두가 일종의 숭배를 보여 준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기리고 추앙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실질적 매개가 된다. 숭배는 곧 공동체의 언어이자, 정체성을 묶는 끈인 셈이다.
시인 메리 조 방(Mary Jo Bang)은 바로 이 지점을 예리하게 주목한다. 그녀는 2023년에 발표한 시집 <내가 모두를 연기하는 영화>(A Film in Which I Play Everyone)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자아의 모습, 즉 하나의 고정된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역할을 오가는 '나'를 탐구했다. 그리고 최근에 방의 시선은 사회적 숭배라는 현상으로 확장되는 듯하다. 시인은 단테(Dante)를 번역하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단테의 깊은 신심에 매혹된 후 예수의 생모 마리아를 다시 불러내어 현대의 언어로 다채롭게 변주한다.
이 시들 중에서 '마돈나 개요'(Madonna Overview)라는 시는 매우 흥미로운 병치를 보여 준다. 중세의 성모 마리아와 현대 대중문화가 만들어 낸 팝 아이콘 마돈나. 이 둘은 너무나 다른 두 인물처럼 보이지만, 방은 이들이 사실상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한다. 둘 다 시대가 만들어 낸 숭배의 대상이며, 집단적 열망과 상상의 투사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는 것이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숭배라는 행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숭배의 대상은 신성하든 세속적이든, 결국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시인은 그 거울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어디쯤 있는지를 묻는다. 우리가 숭배하는 순간,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리 조 방 - 마돈나 개요 (번역: 조희정)
컬트적 인물이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의 역설이다.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현실이라 불리는 것과 겨우 연결되면서,
동시에 존재에 대한
관습적인 가정들과도 얽혀
거의 신에 가까운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애매한 상태에서 그들은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이자
무대 한가운데가 존재하게 된 유일한 이유로 함께
역할을 맡는다. 컬트적 인물은 죽지 않는다, 분명한
장점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상이 되고, 놀잇감이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적대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지적 유희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콘들이 사후의 추상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아니. 누구든 자기 이름을 딴
달리아 꽃을 갖게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해도—
자연이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착각하면서—
그 길은 간과한다, 자연이란
또 하나의 무의미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끝없이 감탄을
늘어놓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새로운 현실을 손에 넣는
방식으로. 그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그랬으면 하는 대로
믿어버리면 된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소녀'를 컬트적 인물로 만드는
가능성이다—그녀는 동정녀일 수도 있고,
혹은, 알다시피, "마치 동정녀처럼"일 수도 있다.
시라기보다 논설문의 첫 문장처럼 시작되는 이 시의 서두에서 방은 "컬트적 인물이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의 역설"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많은 청소년이 아이돌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SNS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요즘 세상에서, 대중으로부터 숭배를 받는다는 가능성은 그저 황홀하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인의 눈은 그 황홀함 뒤에 도사린 역설을 집요하게 바라본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컬트적 인물들은 늘 모순된 "역설"의 자리에 서 있다. 그들은 실제로는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이지만, 대중에게는 어느새 신적인 이미지로 변해 버린다. 구체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얼굴과 목소리는 사라지고, 추측과 소문, 기대와 욕망만이 남는다. 그래서 숭배를 받는 이는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이면서 동시에 "무대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애매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진짜 숭배의 대상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여러 인물이 인기와 관심을 끌었다가 금세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오랜 세월 끈질기게 추앙받는 누군가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컬트적 인물"은 사람이라기보다 일종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적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라도 벌어질 때면, 이들의 존재는 마치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가지지 않은 물건처럼 마구 언급되고 때로는 희화화된다. 예컨대, 우리는 소위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 석 자를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숭배의 대상이라면 더욱더 존중하는 말투와 어조로 그를 지칭할 거 같지만, 사실은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대중의 언어는 마치 그를 사물처럼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숭배의 대상이 간단히 "사후의 추상"으로 변하여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는 않는다. 시인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달리아"라는 꽃을 비유로 끌어온다. 누군가가 "달리아"라는 이름으로 "자연" 속에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소망이 그냥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애초에 "자연"이란 끝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자연"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관념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도 "달리아"도 일종의 비유처럼 끊임없이 재생산될 뿐 어떤 명확한 대상으로 단순하게 못 박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들 역시 추상화된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치환될 수는 없다.
시인에 따르면, 결국 숭배의 대상이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는 사랑하고 추앙하는 이들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포스터에 포착된 아이돌 스타의 표정은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다가가며, 그 표정 이면의 사건과 감정은 팬들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다.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보여 주는 이미지를 멀리서 예쁜 그림을 바라보듯 감상할 뿐 아니라 이런저런 상상을 통해 해석하고 최대치의 의미를 부여하여 떠받든다. 사실 타인에 대해 인식할 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하게 마련이지만, 숭배의 대상을 언급하거나 이해할 때는 아예 그런 "상상력"을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용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숭배의 과정에서 "현실"은 부정되고 삭제되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악성 루머가 떠돌 때 막상 진실이 무엇인지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듯, 그들을 칭송할 때 역시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들은 어느새 지워질 때가 많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개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 내는 이미지다. 현실이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든, 대중은 그 바람을 성취해 주는 듯한 대상의 모습을 상상하여 만들어 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진짜 삶의 흔적들은 배제해 간다. 이렇게 해서 숭배란 본질적으로 "현실"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동경과 추앙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숭배라는 현상이 대부분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기에, "상상력"의 집단적인 방출을 통해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는 시대적 아이콘들은 특정한 의미의 망 속에서 움직이면서 역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시에서 "마돈나"라는 이름의 두 여인이 소환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나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예수의 어머니이자 정결한 "동정녀"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새롭게 구현되어 온 성모 마리아. 그리고, 80년대에 스스로를 "마돈나"로 부르면서 등장한 이후 "마치 동정녀처럼"(Like a Virgin)을 외치며 도발적인 음악과 자기표현을 통해 여성에 대한 기존의 시선에 정면으로 도전해 온 팝 아이콘. 이 두 명의 마돈나는 극과 극에 존재하는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인은 이들이 대중들의 "상상력"에 기대어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마치 거울상과 같이 서로 닮은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숭배라는 사회적 현상에 담긴 진실을 추적하면서, 이 시는 숭배를 그만두라고 독자를 다그친다기보다는 숭배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상상력"에 대해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해 보라고 말하는 듯하다. 숭배가 맹목적인 방향으로 치닫지 않고 "상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되새기는 열린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창의적인 영감을 낳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이 역설이야말로 숭배가 지닌 가장 흥미로운 진실인지도 모른다.
원문: Madonna Overview
Being a cult figure is the essence of being
a paradox in which someone
has managed to get themselves linked
to the theoretically real while
simultaneously getting themselves tied
to conventional assumptions about being
this close to being a deity. They may,
in that cryptic state, serve as both
an extra without lines and the sole reason
center stage was invented. A cult figure
can't die, clearly a plus. Likewise,
they get to be objects, playthings
of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like minds
and antagonists. That said, these icons
are never merely after-the-fact abstractions.
No. Although anyone can hope
to have a dahlia named after them—
wrongly assuming that nature will then
be forced to remember their name—
that path ignores the fact that nature
is yet another meaningless conceit
over which people gush and go on and on
about. "Using one's imagination"
is a far better way of gaining possession
of a new reality. One simply denies
reality in favor of believing
whatever one wants reality to be. It is this
that makes it possible to turn a 'special girl'
into a cult figure—one that can be either
a virgin, or, you know, "like a virgin."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