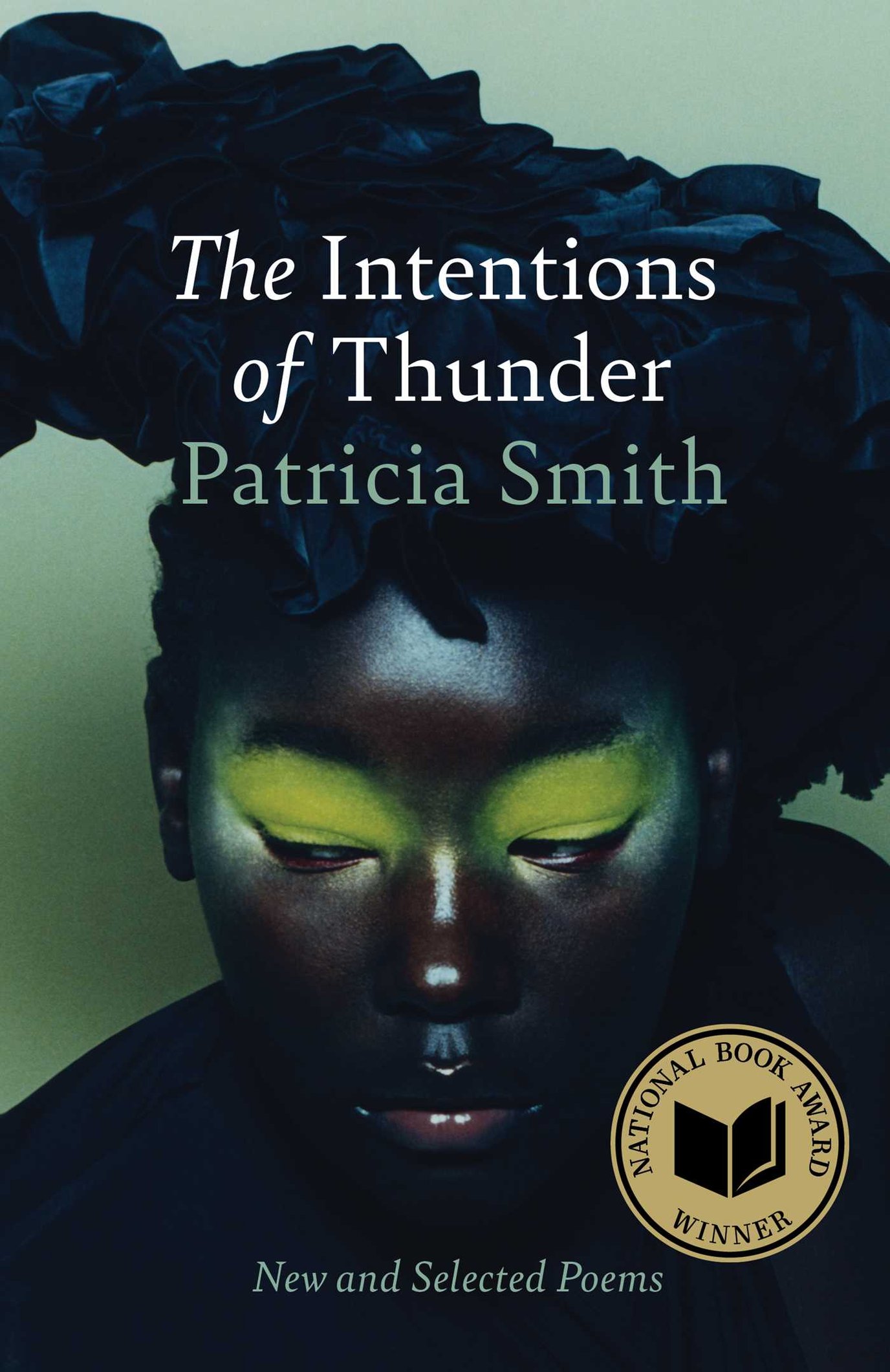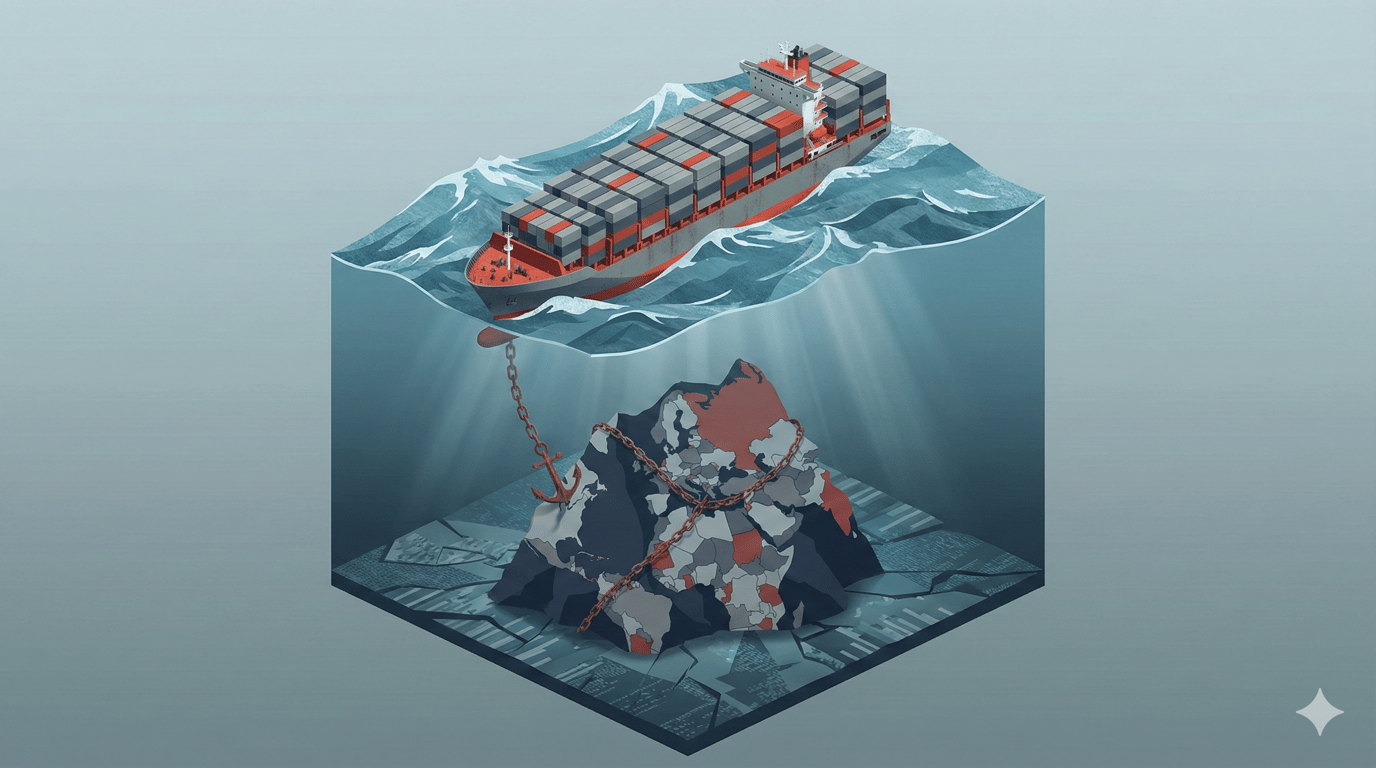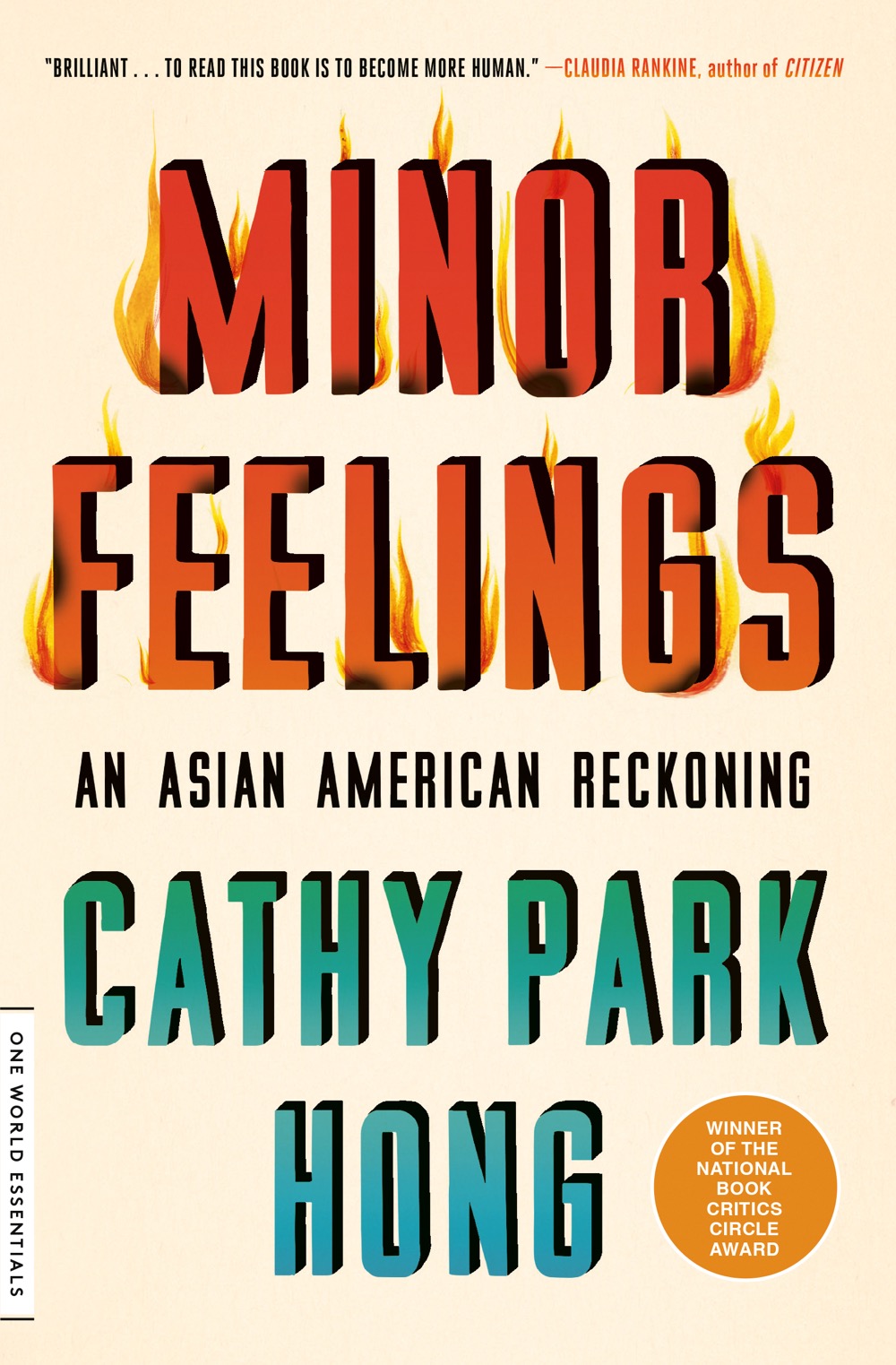
캐시 박 홍의 에세이집 '마이너 필링스'(2020) 표지. /사진제공=Penguin Random House
2025.10.24 16:07
- 0
요즘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AI가 화두인 것 같다. 인공지능의 출현을 두고 수많은 예상과 추측이 이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 알파고가 바둑을 두던 그때만 해도 AI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소재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리고 핸드폰을 여는 순간, 우리는 매우 손쉽게 AI와 대화할 수 있으며 별것 아닌 사소한 질문에도 꽤나 정교한 답을 듣는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지만, 그만큼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리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미래에 대한 가슴 설레는 기대보다는,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되돌아온다.
한국계 미국인 시인인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은 이런 시대의 공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한다. 박 홍의 연작시 <클라우드 세계>(The World Cloud)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버린 세계, 인간의 기억마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사회의 풍경을 시적인 언어로 그려낸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번역된 에세이집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에서, 박 홍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에서 마주한 사소하지만 무거운 소외와 차별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바 있다. <클라우드 세계>에도 아시아계 테크 노동자들의 애환이 깔린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나지만, 이 연작시는 인종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 자체가 기술에 의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주로 탐구한다. 시인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기술이 우리 삶의 내부로 스며드는 순간의 서늘한 감각을 독자와 공유한다.
<클라우드 세계>의 대표적인 시 '왕좌 속의 엔진들'(Engines Within the Throne)에는 디지털 사회의 차가운 냉기와 그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도구'로 남아 있지 않고 인간의 내부로 침투해 사고와 감정의 회로를 바꾸어 놓는 '권력'을 가진다. 이제 기술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언어를 흉내 내고, 기억을 보관하며,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계산한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당신의 말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
캐시 박 홍 - 왕좌 속의 엔진들 (번역: 조희정)
우리는 한때 사무원으로 일했지
좀먹은 문서들을 스캔해서
클라우드 속으로 보냈어, 모든 기억은
외주화되었고 희미한 어린 시절의
조각만 남았지, 그때
나는 왜소한 소녀였고 틱(tic)이 있었어,
그들은 내게 보톡스를 주입했지.
나는 멍청한 표정의
피부에 달라붙은 옷이 되었고, 수치심 위에
찍힌 지문들 뿐이었어.
내가 원한 건 그저 눈(snow)이었어
태양의 칼날을 꺼뜨려서, 바퀴살을 그늘지게 하며,
고속도로의 북소리를 잠재우고, 낡은 리얼리즘을
지워버리는 눈.
하지만 이 똑똑한 눈(snow)은 아무것도
지우지 못하고, 모든 곳으로 스며들어,
검색 엔진은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은 우리의 디스플레이야.
이제 모든 산업은
사무실 책상들 전체와 컴퓨터들,
팩스 기계들을 개발도상국에다
버렸어, 거기서 그들은
그것들을 쌓아 분쟁 지역의
어떤 벽으로 만들까.
우리는 옛날식으로 정보를 모으려고
러시아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나이 든 스파이에게 물었어.
이제 우리는 눈(snow)으로 된 센서를 가졌어.
그래서 누구의 마음 속으로든
탐험을 떠날 수 있지.
당신의 어린 생각을
잠시 빌려줘, 그건 무해한 감시야,
나는 안으로 파고들어, 바위 색깔
넙치가 있는 동굴 속 웅덩이를 찾아내지.
그리고 너를 만나지, 우울감에 빠져
반쯤 투명한 너를.
이 시는 연작시 <클라우드 세계> 가운데서도 특히 기술이 인간의 내면에 스며드는 과정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시는 "우리는 한때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회상으로 시작된다. "사무원"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시 속 화자가 기억하는 테크 노동자로서의 삶은 창조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반복적인 업무의 연속일 뿐이다. 이들은 오래된 종이 문서를 넘기면서 그 속에 담긴 모든 기록을 하나씩 "클라우드" 속으로 스캔해 올린다. 종이 위의 기억은 사라져 가고, 인간의 경험은 점차 저장 가능한 것으로 환원되어 간다. 시인이 말하듯이 이렇게 "모든 기억이 외주화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어린 시절의 희미한 조각" 뿐이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감정 대부분이 이제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맡겨지는 것이다.
시 속의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왜소한 소녀였고 틱(tic)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틱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가 주입되었을 때, 소녀의 얼굴은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피부에 달라붙는 옷"이 되어 버린다. 물론, 이런 치료를 꼭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톡스"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소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얼굴을 소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과학기술은 아이의 신체와 표정을 통제하고, 결국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안면 근육은 감정의 회로마저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장면은 화자가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전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규격화된 모습으로 외모를 관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듯하다.
화자는 한때 "눈"(snow)을 원했다고 말하면서, "눈"이 "태양의 칼날을 꺼뜨려서, 바퀴살을 그늘지게 하며, 고속도로의 북소리를 잠재우고, 낡은 리얼리즘을 지워버리기"를 기대했다고 회상한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점점 더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개인의 개성까지도 삭제해 버리는 상황 속에서, 화자는 문명의 진보를 상징하는 "바퀴살"과 "고속도로"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갈망했다. 자연 현상인 "눈"이 내려와 온 세계를 하얗게 덮음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최상의 가치로 놓는 근대의 "낡은 리얼리즘"이 무너져 내리고 문명의 발전에 대한 오래된 신화가 잠시 멈춰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의 다음 부분에서는, 원래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똑똑한 눈(snow)"이 화자가 기대했던 자연 현상으로서의 눈 대신 등장한다. 이 "똑똑한 눈"은 아무것도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곳으로 스며든다. 기술의 발전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더욱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면서, 심지어는 인간의 내부로까지 성큼 들어오는 것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검색 엔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화자의 말은 기술이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우리의 사고와 기억, 감정은 점점 더 알고리즘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적 개인에 대한 환상은 아스라이 사라져 간다.
후반부로 갈수록 시의 어조는 한층 더 서늘해진다. "이제 우리는 눈(snow)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은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감시하는 도구로 변해 가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화자는 이제 "누구의 마음 속으로든" 들어가서 "탐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탐험을 "무해한 감시"라고 부르는 표현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그 감시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가 타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위"와 닮은 보호색을 띠고 "넙치"처럼 바닥에 숨어 있는 "너"의 존재이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시의 결말을 쓸쓸하고도 불안하게 물들인다. 어쩌면 화자가 만나는 "우울감에 빠져 반쯤 투명한 너"는 바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시와 연결이 일상이 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시는 기술문명에 대한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 지배와 통제를 행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것을 찾으려는 시인의 시선을 함께 담고 있다. 시의 마지막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너"는 "반쯤 투명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남아 있지도 않은 상태, 아마도 그것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래도 끝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인간다움의 흔적일 것이다. 시인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이 "반쯤 투명한" 존재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매 순간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다. 기술은 우리를 관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응시하는 그 틈, 투명과 불투명의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간격이야말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지점일지도 모르겠다.
원문: Engines Within the Throne
We once worked as clerks
scanning moth-balled pages
into the clouds, all memories
outsourced except the fuzzy
childhood bits when
I was an undersized girl with a tic,
they numbed me with botox
I was a skinsuit
of dumb expression, just fingerprints
over my shamed
all I wanted was snow
to snuff the sun blades to shadow spokes,
muffle the drum of freeways, erase
the old realism
but this smart snow erases
nothing, seeps everywhere,
the search engine is inside us,
the world is our display
and now every industry
has dumped whole cubicles, desktops,
fax machines into developing
worlds where they stack
them as walls against
what disputed territory
we asked the old spy who drank
with Russians to gather information
the old-fashioned way,
now we have snow sensors,
so you can go spelunking
in anyone's mind,
let me borrow your child
thoughts, it's benign surveillance,
I can burrow inside, find a cave
pool with rock-colored flounder,
and find you, half-transparent
with depression.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