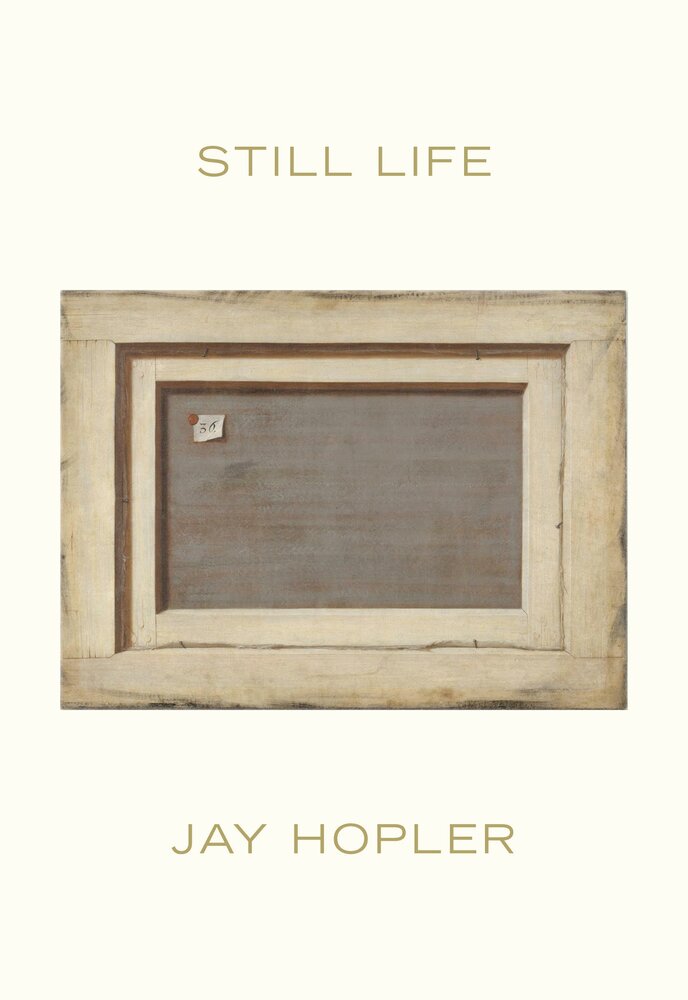
멀리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일상의 흐름 속으로 불쑥 스며드는 순간은 언제나 조금 당혹스럽고 불편하다. 지인이 가족의 소천을 알리는 부고를 보내올 때, 또 한 시대를 풍미하던 어떤 인물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잊고 있었던 삶의 유한성을 갑자기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숙연해진다. 이렇게 가끔씩 상기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류가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켜 온 과정에서도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커다란 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을 어떤 흔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언젠가 끝나게 될 삶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그 자체로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시에 붙여진 '시성'(謚聖, The Canonization)이라는 낯선 제목은 17세기 초반 영국의 시인인 존 던(John Donne)이 쓴 시에서 유래하는데, 던의 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문학의 힘을 종교적으로 '성인'(聖人)이 되는 의식에 비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한 무덤이나 화려한 영구차, 그리고 연대기 속의 멋진 기록과 같이 위대한 인물들의 죽음과 결부되는 의례들이 가난하고 초라한 시인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지만, 던은 대신 "잘 빚어진 항아리"(well-wrought urn) 속에 자신의 유골을 남긴다. 시인의 존재를 죽음 이후에도 보전하는 이 "잘 빚어진 항아리"는 시를 은유하며, 던은 이 은유를 통해 자신의 시가 후대에까지 전달되어 영속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다.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성인"(聖人)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이, 후세의 독자들 역시 "잘 빚어진 항아리"인 시를 매개로 시인을 잊지 않고 늘 가슴 속에 담아 둘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는 셈이다.
제이 호플러 - 시성(謚聖) (번역: 조희정)
(데이비스 아일랜드, 플로리다, 2020년)
섬에서 죽으리라 확신하는 누구도
그가 그 섬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섬에 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섬에서 살았다
마지막 운(韻)에 대해 이야기하라
하지만 나의 삶은 나의 죽음이 오랫동안
써내려 왔던 시이고
죽음은 잘 빚어진 항아리를 혐오한다
나는 끝났고
그들은 내가 쓰러진 곳에서 나를 태우겠지
사시나무가 하늘의 푸른 벽에 대고
박수치듯 소리 내며 재를 내보낼 테고
그들은 이 시들 역시 태워서
우리 모두를 무(無)로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들이 연기 속에서 흥청거리고
죽음은 내 삶을 놓고 흥청대겠지
그리고 삶이 만든 작품은 질식하겠지
나는 끝났다
나는 죽음이 어떤 항아리든 만들도록 둔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여러 해 동안
어머니가 창턱에 두었던
재가 든 자루였다
그건 그를 별로 괴롭게 하는 거 같지 않았다
내가 떠날 때
나는 아버지를 섬에 남겨 두었다
제이 호플러(Jay Hopler)는 이 시에서 존 던의 시와 똑같이 '시성'(謚聖)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지만, 막상 시의 내용은 던의 시에 대한 현대적 패러디에 근접해 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잘 빚어진 항아리"는 아무 힘이 없을뿐더러, 시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떤 "항아리"가 만들어지게 될지조차 죽음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호플러가 이 시를 쓸 당시에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쓸쓸한 전망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덧붙인다. 연기 속에서 자신도 시도 결국 타서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던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서 재가 된 아버지의 유해가 "항아리" 속에 고이 보존되기는커녕 "자루"(sack)에 담겨 창가에 놓여 있었을 뿐이라고 회고한다. "자루"에 담긴 재 한 줌에 불과한 아버지의 흔적을 "섬"에 남기고 떠나오는 호플러의 모습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섬"에서의 죽음을 확신하는 호플러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본원적인 외로움을 직시하며,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신의 시들 역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자루"와도 같이 그저 어딘가에 놓여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 르네상스 시기에 유독 시의 영원성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많은 작품에서 나타났던 근저에는 인쇄술의 보급이라는 문화사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필사의 방식으로 유통되고 보관에 극히 취약했던 이전의 책에 비해, 인쇄물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새로운 책의 물성은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시간의 힘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게 했을 것이다. 반면에, 텍스트가 넘쳐나고 컨텐츠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면 1인 출판을 할 수 있고 AI조차 글을 쓰는 21세기의 상황에서, 시의 영원성은 커녕 지속성을 꿈꾸는 것조차 참으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오늘날 많은 글들은 그저 잊혀지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플러가 세상을 떠나고 2주 후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시집은 평단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으며, 2022년 미국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데 이어 2023년에는 퓰리처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호플러의 시는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의 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학상이나 권장도서, 서평 등 훌륭한 작품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전통적 기제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읽을 만한 글을 선별하여 널리 알리는 공동의 작업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잘 빚어진 항아리"의 모습으로 오랜 기간 남아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시가 그나마 괜찮은 "항아리"에 담겨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호플러의 시를 다시 읽다가 "나의 삶은 나의 죽음이 오랫동안 써내려 왔던 시"였다는 구절에 문득 눈길이 머문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 버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이제 더 이상 시를 통해서도 삶의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담한 어조로 시를 쓴 호플러가 마지막까지 독자와 나누기를 원했던 메시지는 어쩌면 이 구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호플러에게 죽음이 규정하는 삶, 유한성으로 괄호 쳐진 인생은 마냥 적막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로 승화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었던 듯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 편협함의 좁은 터널에서 빠져나와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져다 주는 사명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호플러의 마지막 시집에는 '정물화'(Still Life)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꽃이나 과일 등의 생명체가 시들어 버리기 전 정지된 모습을 포착한 그림이 "정물화"의 유래였기에, 이 제목은 언뜻 보기에 "정지된 생명"(Still Life)이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호플러가 독자에게 진정 원했던 것은 이 시집의 제목에서 "여전히 삶"(Still Life)을 긍정하고 "여전히 삶"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하루하루 분량의 "삶"을 살아내는 자세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아니었을까? 먼저 지상을 떠나간 시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삶을 "시"로 만들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된다.
원문: The Canonization
(davis islands florida 2020)
no man convinced he was going to die
on an island would on an island live
unless he wanted to die
on that island & i did
talk about an end rhyme
but my life's a poem my death's
been writing for a long time
& death abhors a well-wrought urn
i'm done
& they will burn me where i fall
the aspen clapping ashes
against the sky's blue wall
& they can burn these verses
too send us all to naught
let them revel in the smoke
let death upon my life
& life's work choke
i'm done
i leave death to work what urn
it will
my father was a sack
of ash my mother kept
on a windowsill for years after he passed
it didn't seem to cause him much distress
i left him on the island
when i left
제이 호플러(Jay Hopler)는 시인이자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시집 '녹색 스콜'(Green Squall), '강우의 축약판 역사'(The Abridged History of Rainfall), '정물화'(Still Life)를 냈다.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